깜빡 깜빡이는 커서를 보며 일단 긴 한숨 시전.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물 한잔 마시고. 유튜브로 음악을 킬까? 고민을 해본다. 뭔가 잘쓰고는 싶은데, 머릿속에서 글자들이 뱅글뱅글 돌고 키보드에 얹고 멈춰있는 내 손가락들은 미처 그 글자들을 치지 못하고 허공에다가 피아노를 쳐댄다. 몸만 푼다. 아니 손가락만 푼다.
블린이(블로그+어린이) 1개월 차의 깜빡이는 커서 앞에서의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1개월 차라고 하기에 어색하네요. 아직 횟수로는 1개월이 안되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던가요. 그래도 용감하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편집도 어색하고, 글도 어색하고, 모든 게 어색하지만 나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작은 기대감이 이 플린 이를 지탱해주는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글이 잘 쓰여지지 않을 때의 필수도구는
바로 '퇴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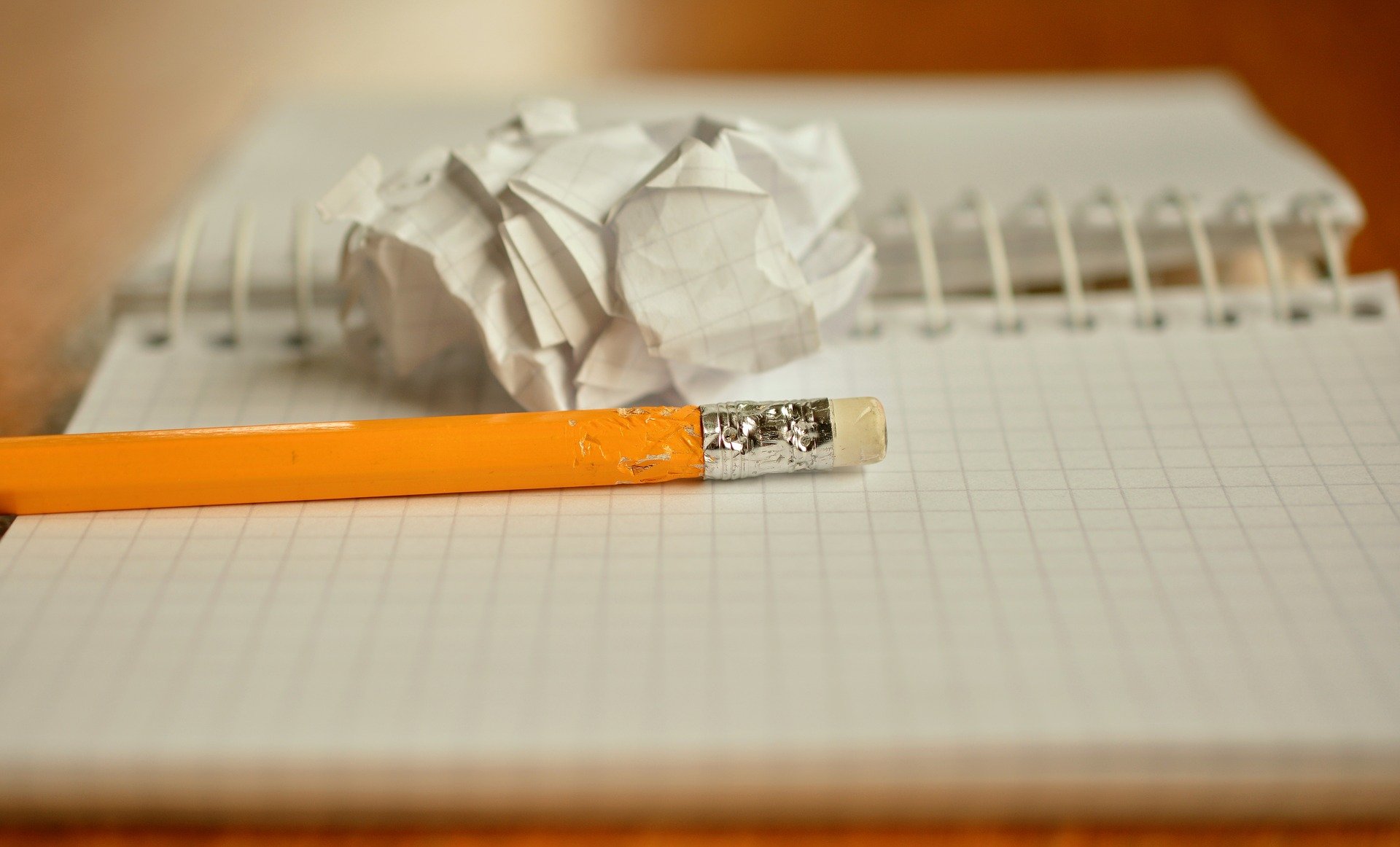
제가 무식, 용감하게 마음대로 써 내려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쓰고. 다시 보고 다듬고. 다시 보고 다듬습니다.
아직 다듬는 기술이 없어 다듬어도 똑같긴 합니다.
그래도 다듬으면 0.00001%라도 나아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방금도 약간 다듬었습니다.
뭔가.. '했다. 해본다' 등등 반말형으로 써내려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경어체로 바꿨습니다.
뭔가 읽는 이를 존중하는 느낌. 그런 느낌. 좋습니다.
언젠가 책을 읽다가 퇴고의 고사를 설명해 준 내용이 있어 메모를 해뒀습니다(메모하기를 잘했습니다)
퇴고 고사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당나라 때 사람 가도는 유명한 고음파(시어 하나하나 진지하게 꾸미는) 시인이었습니다.당나라 중기 맹교와 가도 등의 시인들은 시 창작에서 문사를 퇴고하는데 무척 고심하였다고 합니다. 한번은 가도가 과거를 보러 장안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던 중 문득 시상이 떠올라 “새는 연못가 나무 위에 잠들어 있고, 스님은 달 아래 문을 두드리네”라는 시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두드린다는 ‘고’ 자를 써야 할지, 민다는 ‘추’를 써야 할지 고민이 되어 나귀 위에서 글자대로 두드리는 동작과 미는 동작을 반복해서 해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대 문장가인 한유의 행차가 나타났습니다. 가도를 수상하게 여긴 병졸은 가도를 한유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도는 자신이 길에서 바로 비키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시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유는 그의 말을 듣고 거마를 멈추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 자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둘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바로 이 일화에서 ‘퇴고’라는 유명한 고사가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아직은 단어 하나하나에 혼을 담지도 못하고,
하얀 공간에 아무 글자나 배열하기도 바쁘지만
'퇴고'는 그러한 글들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는
마법과 같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쓴 글이 부끄럽지만 보고 또 봐서 고쳐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일단 쓰고, 고친다' 는 정신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한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밤, 좋은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